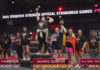-초고령사회 속 장기요양등급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일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숫자만 보면 준비된 사회 같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수치를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고령화는 곧 돌봄의 문제이고, 돌봄은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제도가 잘 짜여 있어도, 그 제도에 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결핍된 복지일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등급제도는 대표적인 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이 등급을 판정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설 입소 등 다양한 국가 지원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노인의 존엄한 일상을 지켜주고자 마련한 장치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절차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버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마주해왔다.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다. 평생 혼자 사신 78세 어르신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냥 좀 불편한 거지, 나는 아직 괜찮다”며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지내고 계셨다. 그러다 이웃 주민의 권유로 지자체 복지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았고,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정조사 후 등급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그 순간 어르신은 다시 문을 닫았다. “국가가 안 된다고 하니 그만이지요.”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도 가능하며, 소명자료와 상태기록을 충분히 제출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과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 나에겐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느껴졌다.
행정사로서 나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다. 등급 신청 자체를 몰라 아예 접수를 못한 경우, 조사 당시 긴장해서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심지어 등급은 나왔지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몇 개월간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와 사람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도를 설명해주는 전문가가 절실한 시대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평가해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구조다.
하지만 실생활 속 어르신들의 사정은 수치 하나로 다 표현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보호자와 상담하며 작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정리해 제출하는 그 과정은 행정절차라기보다 ‘삶을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돌봄 권리를 되찾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현장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내가 행정사로서 현장에서 하는 일은 누군가에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일이 한 어르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신청서를 대신 써주고, 서류를 정리해주고, 불승인 통보 뒤에 이의신청을 함께 준비했던 순간들 속에서 나는 행정사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느낀다.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제도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설명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안내가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은 그 문턱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많은 제도다. 그래서 제도를 아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중요하다. 어르신 스스로는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 뒤에 숨겨진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그런 손이 되기 위해 일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신청서와 상담 전화를 다루지만, 결국 내가 하는 일은 한 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제도 안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일이다.
그 일이 반복되면, 누군가에게는 단절된 삶이 이어지고, 외로운 노후가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다. 제도는 멀고 낯설지만, 그 거리를 좁혀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사회’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설명 한마디, 신청서 한 장, 손 내미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행정사로서 나는 그 시작이 되는 일에 내 하루를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언젠가는 ‘제도가 먼저 다가오는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추천기사
1. 김혜자와 똑 닮은 예비 의사 손녀 최초 공개2. 반려견 수술비 1400만원 때문에 이혼 위기라는 부부
3. 음주운전 걸린 ‘극한직업’ 배우 송영규 “대기 부르긴 했는데…”
4. 현직 경찰은 왜 실탄 44발을 빼돌려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을까
5. 머리 빡빡 깎은 차은우…입대 전 마지막 말